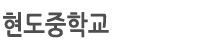12. 나무 |
|||||
|---|---|---|---|---|---|
| 작성자 | 주형식 | 등록일 | 14.10.08 | 조회수 | 347 |
|
12. 나무
나는 여러 사물 중에서 특히 나무를 좋아한다. 나무 이름이나 효능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좋다. 동양의 주역에 나오듯 태어난 일시와 관련하여 나무 목(木)이 많아서일까, 한의학의 사상체질에 나오듯 소음인처럼 몸매가 말라서일까? 짐짓 갸우뚱 하지만 어쨌든 나무라는 말 자체가 좋다. 누가 누구를 좋아할 때 ‘그냥 좋아서’라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하여 소설이나 시 내용 중에 나무라는 말이 나오거나 제목으로 했을 때 더 눈을 가까이 한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 얼마 전 북부유럽 핀란드에 갔을 때 화강암 위에서 큰 전나무가 힘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뿌리 깊음’의 철학을 재삼재사 느꼈다. 나 자신도 든든한 나무처럼 튼튼한 뿌리를 갖고 싶다. 그건 뭘까?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실력은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 처세, 노력뿐 아니라 스스로 많은 독서와 사색, 글쓰기, 대화 등을 통해 얻는 정신적인 푸짐함과 넉넉함이다. 즉 지혜의 지경과 지평이리라.
나무에는 덩치와 줄기가 있다. 아무나 와서 치대도 견딜만한 아름드리 덩치, 누구라도 와서 그늘에 더위와 비바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파리 가득한 줄기가 있다. 그건 무수한 사색과 성찰을 통해 단련된 예의, 친근감, 끌림의 미덕이다. 뿌리는 든든한데 덩치와 줄기가 빈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무에는 자기 나름의 꽃과 열매가 있다. 나 만의 모습, 나 다운 모습 그러니까 재주, 취미, 특기, 특별한 인상은 꽃이라고할 것이요, 그 누구라도 내게로 와서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건조함을 치료와 치유받을 수 있게 하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열매이다.
나무라는 낱말이 참 좋다. 우선 한자(漢子)로 나무 목(木)자를 보자. 땅이 가로로 있는데 아래에 묻힌 것은 세 가닥, 위로 나온 것은 한 가닥이다. 일대 삼,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기 위해 기초 세 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의미심장한 모습이다. 그럼 한글로 나무의 뜻을 생각해보자. ‘나’는 나온다는 말이요 ‘무’는 무(묻)친다는 것이다. 물론 음성학이나 생물학적으로 분석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올 때 나오고 묻힐 때 묻히는 것을 잘 분별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나부대지 말아야 한다는 화두를 주는 것 같다. 누군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나무’라는 말을 만든 분의 지혜가 놀랍다(물론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무에 관한 시, 노래, 글을 좋아한다. 하여, 정호승의 시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의 시를 낭송한다. 길을 갈 때, 등산할 때 볼 폼 없이 아무렇게나 생긴 나무일지라도 굳이 의미를 찾으려 손으로 만져본다. 마치 프랑스 ‘생의 철학자’들이 갈구하거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를 체험하고난 후 정립한 로고데라피(의미요법)에서의 자기 존재 의미 찾기를 인생의 모퉁이에서 고독하게 하길 즐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래동요 ‘나무’ 가사를 적어 보았다. (전래노랫말, 백창우 작곡 / 김현성 노래)
가자가자 갓나무 오자오자 옻나무/ 가다보니 가닥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한자 두자 잣나무 다섯 동강 오동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아이 업은 자작나무/ 앵도라진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푸레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불 밝혀라 등나무/ 목에 걸려 가시나무 기운 없다 피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텀벙텀벙 물오리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이놈 대끼놈 대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빠르구나 화살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인터넷에 어떤 이가 이렇게 덧붙였다. 말아먹자 국수나무 망했구나 작살나무/ 오줌누세 쉬나무 반말찍찍 야자나무/ 았따 쓰네 소태나무 잘 그린다 회화나무/ 네가 해라 미루나무 요리조리 박쥐나무. 필자도 하나 덧붙였다. 이 책 좋다 주목나무)
|
|||||
| 이전글 | 13. 세 가지 글쓰기 |
|---|---|
| 다음글 | 11. 송파구 세 모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