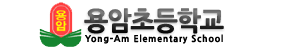환경호르몬 검출 ‘먹는 샘물’ 제품 1년새 6배 급증 정부 “플라스틱 병과 뚜껑서 흘러들어간 듯” 가정에서 흔한 김치·반찬·음료수통도 문제 일부선 “시판 향수·매니큐어에서도 나와”
환경호르몬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주거공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포진해 있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는 플라스틱 병 안에 든 생수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환경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요주의 대상은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은 주로 음식 섭취를 통해서다. 어류나 육류, 채소 등을 통해 다이옥신이나 노닐페놀, 비스페놀A 그리고 엔도설판(맹독성 농약) 같은 각종 환경호르몬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음 식물을 담는 용기는 환경호르몬을 옮기는 주요 통로이다. 그중 수년 전부터 가장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각종 음식용기에서 음식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5월 31일 환경부가 공개한 ‘생수(먹는샘물) 중 환경호르몬 함유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재확인됐다. 작년 한 해 동안 국산과 수입생수 582개 제품(63개 제조업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DEHP는 146개 제품(25.1%)에서, DEHA는 149개 제품(25.6%)에서 검출됐다. 2005년 조사 때는 548개 제품 가운데 DEHP는 24개(4.4%), DEHA는 22개(4%)에서만 검출됐으나 이번에 여섯 배 가량 검출비율이 껑충 뛰었다.
정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병과 뚜껑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이 생수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중 수입생수 84개 중 35개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국산생수보다 검출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이들 생수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의 농도는 모두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72% 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환경호르몬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제 김치통과 각종 음료수병, 반찬통, 도시락통 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용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정부는) 사람들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호르몬을 위험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식계통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경호르몬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노출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디에, 어떤 환경호르몬이 있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보호청(EPA) 같은 전문기구들이 현재까지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한 화학물질은 67~143종이다.〈표 참조〉
최 근 국제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환경호르몬은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로 불리는 화학물질이다. TV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의 외장재나 카펫 같은 실내용품 등 플라스틱이나 섬유를 원료로 한 각종 제품에 들어 있다. 이 제품들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첨가하지만,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서도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대 김종국 교수(환경공학과)는 “컴퓨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본체가 뜨거워지면서 PBDE가 공기 중에 퍼져 나온다는 사실이 최근 국제학회에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실내에 향기를 뿜어내는 각종 방향제나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매니큐어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다. 이들 제품에 든 DEP(디에틸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도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다. 여성환경연대는 31일 “시중에 팔리는 향수와 매니큐어를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DEP와 DBP가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