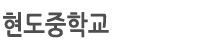23. 동서고금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 |
|||||
|---|---|---|---|---|---|
| 작성자 | 주형식 | 등록일 | 14.12.01 | 조회수 | 370 |
|
동서고금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여보! 밤12시가 넘었는데 뭐해요?”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묻는다.“응, 신문 봐요.”“아니, 낮에 학교 가서 안 봤어요? 에궁, 신문값 내고 구문을 보고 있네.” 아내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매일 신문(新聞)을 받아 구문(舊聞)으로 읽는다. 아침에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학교출근 때 가져가서 쭉 훓어보고는 늦게 퇴근해서 미리 점찍어 놓은 기사(칼럼 등)들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우리 세대 거의가 그러했듯이 6․70년대에 학교를 다닌 이들은 가난하게 살았다. 지금 교무실 내 책상 위와 둘레에는 여러 책과 신문들이 옹기종기 쌓여있지만 그 시절에는 신문 구독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여러 신문사에서 매일 신문을 발행은 했다. 하지만 구독료를 내야했기에 살기 힘든 집에서는 누가 보고 버린 구문지는 구할 수 있어도 새로 나온 신문지 구하기는 언감생심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신문 정기구독을 하셨다. 가난한 집인데 왜 그리 하셨을까? 아마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거나 특별한 취미가 없으셨기에 그 답답한 마음을 풀기위해, 많은 세상사의 움직임을 혼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신문을 마주하셨으리라. 당시 중․고등학생인 나는 아버지 발치에 앉아 언제쯤 신문을 밀쳐 놓으시려나 궁금을 떨었다. 중얼중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눈으로 빨리 안 읽으시나 야속하기도 했다. 드디어 아버지 손을 떠난 신문은 내 차지가 되었다. 작은 내 방에 가서 처음부터 맨 뒤에까지 꼼꼼하게 읽었다. 뉴스는 아나운서, 사설과 칼럼은 연설가, 해설은 이야깃꾼, 연재소설은 성우처럼 작은 소리로 옹알옹알 낭독을 했다. 멋진 글을 보면 그냥 가슴이 설레었고, 별로다 싶은 글을 보면 이유가 뭘까 싶어 더 꼼꼼하게 살폈다. 50대 후반인 지금도 마치 닭이 모이를 쪼아 먹듯이 글자 하나하나를 콕콕 눈으로 찍어 읽는다. 피 말리는 마감시간을 지키려 시계를 보면서 몇 번이고 수정을 가한 신문을 어찌‘신문 보듯이’적당히 넘길 수 있으랴 싶기 때문이다.
집을 떠나 대학에 다닐 때도 얼마 안되는 용돈이 아까워서 친구 만나는 것과 책사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 대신 신문읽기와 라디오 듣기에 열중하였다. 때로는 그런 내 모습이 측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니 가난함은 신께서 내게 준 축복이었다. 그때 신문은 세상․사람․글쓰기․말하기 공부를 도와준 사부님이었다. 그런 나의 모습은 그 후 첫째 딸애에게 이어져 그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어느 시청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고 딸애가 열매를 맺은 신문읽기 여정이리라. 아니,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관리자인 나는 신문읽기(NIE) 학생․교사 모임을 조직해서 토론도 하고 과제도 풀고 가끔 지역신문에 둔필도 쓴다. 난 그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한다.“내 경험으로 볼 때 신문은 당신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언필칭‘언필의 호 수’요, 말 그대로‘말글의 삼림’입니다.”
신문을 펼칠 때마다 어느 방송 사극에서 조선시대 한명회 역을 맡은 배우가‘이 세상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렇다. 양 손으로 잡은 신문 속에는 동서고금(東西古今 즉 공간적으로는 동․서양,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의 사연과 사실들이 그물 속 고기떼처럼 가득하다. 비록 내 인생이 풍요한 물질이나 기세 높은 권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천하를 두 손 사이로 내려다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게 하는 기쁨이 있기에 행복하다. 깊은 밤에 아내는 비록 구문을 본다고 타박할지라도 나는 살아 꿈틀대는 활자를 본다.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신문을 읽는다. |
|||||
| 이전글 | 24. 자작나무(2014. 학부모문집) |
|---|---|
| 다음글 | 20. 별것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