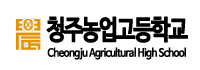바다음식의 인문학 |
|||||
|---|---|---|---|---|---|
| 작성자 | 주재석 | 등록일 | 25.07.26 | 조회수 | 3 |
| 첨부파일 |
|
||||
|
바다음식의 인문학
싱싱한 바다 내음에 담긴 한국의 음식문화 정혜경 저 | 따비 | 2021년 09월 15일
목차
책을 내며 내가 사랑한 바다음식 -5
들어가며 -17
1부 바다를 사랑한 한국인
1장 바다음식의 역사 1: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22 선사시대: 어로와 수렵 중심의 시대 -22 부족국가시대: 어로부족과 농경부족의 대치 -29 삼국시대: 바다음식의 시대 -31 고려인, 고기보다 수산물을 즐기다 -34
2장 바다음식의 역사 2: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61 수산물의 나라, 조선 -61 왕실 잔치에서 중요했던 수산물 -66 개화기, 외국인의 눈에 비친 수산물 문화 -73 일제강점기, 수산업의 근대화? -82
2부 바다음식을 사랑한 조선 사람들
3장 바다를 기록한 조선 지식인들 -92 조선 최초의 수산서, 김려의 『우해이어보』 -94 정약전이 사랑한 물고기와 민초들, 『자산어보』 -98 서유구의 수산물 품평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104 이규경의 물고기 변증론, 『오주연문장전산고』 -109
4장 풍속화로 본 조선의 고기잡이 -116
5장 선비의 일기로 본 조선의 수산물 문화 -130 『미암일기』를 통해 본 수산물 경제 -131 『쇄미록』을 통해 본 수산물 문화 -136
3부 우리가 먹어온 바다음식들
6장 바다와 강의 주인공, 생선 -142 지금은 귀해진 대중 생선 -143 계절의 맛, 지역의 맛 -156 생선 대접도 괄목상대 -167 예나 지금이나 귀한 대접 -178 특유의 흙냄새가 매력적인 민물고기 -185
7장 부드럽고도 단단한 맛, 연체류와 갑각류 그리고 패류 -200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 연체류 -200 단단함 속의 달콤함, 갑각류 -206 인류와 함께해온 조개의 맛 -211
8장 자랑할 만한 식재료, 해조류 -221 한국인의 밥상: 김, 미역, 다시마 -222 어디에도 없는 매력: 우뭇가사리, 매생이, 톳 -229
4부 바다를 요리해온 민족
9장 매일의 밥상을 책임지다 -236 해산물이 주인공인 한 끼, 밥과 죽 -236 국, 탕, 찌개, 조치, 지짐이 그리고 전골 -249 구워야 맛있다, 생선구이 -262 발효 장의 맛이 스며든 생선조림 -267
10장 특별한 날 상에 오르는 -274 반가 도미찜에서 서민 아귀찜까지 -274 고급 요리, 볶기와 초 -279 화려한 생선 요리: 승기악탕, 금중탕, 도미국수 -283 섞어 만드는 어선과 어채 -288 생으로 즐기는 바다, 회 -292 의례음식으로 살아남은 생선전 -304
11장 바다의 맛을 오래오래 -310 발효의 힘, 식해와 젓갈 -310 튀김과 튀각 그리고 부각 -325 자반은 좌반인가 -328
5부 바다음식의 과학, 맛과 건강
12장 생선을 맛있게 먹는 법 -338 물고기는 왜 맛있을까 -338 생선 비린내의 정체와 제거 -343 어떻게 조리해야 맛있을까 -348 생선이 건강에 좋은 이유 -351 생선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357
13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조류 -362 해조류와 건강 -363 해조류로 지구의 건강까지 -365
6부 바다음식의 미래
14장 바다는 아프다 -372
15장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음식을 위해 -378
나가며 -388
미주 -392
책소개
어떤 공동체의 음식문화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을 먹게 되는데다, 그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특성에 따라 음식에 대한 금기가 생기기도 한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몽골이나 스위스의 음식문화가 섬나라인 일본이나 영국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를 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음식문화는 어떠할까? 다양한 바다생선과 조개류는 물론, 해조류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라 할 수 있다. 『바다음식의 인문학-싱싱한 바다 내음에 담긴 한국의 음식문화』는 한반도 사람들을 목숨줄을 이어준 바다음식의 역사와 그것을 구하고 먹었던 사람들의 정서를 아우르고 있다.
책 속으로
기원전 2000년경 고조선이 세워지고, 단군조선을 이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차례로 들어섰다. 기원전 100년경에는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 예맥, 부여, 옥저, 낙랑,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한, 변한의 부족국가가 세워졌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어로부족과 민무늬토기와 농경을 주로 하는 농경부족의 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점차 농경 중심의 식생활로 변천되었다. --- p.29
고려 개경 식생활의 실물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 천년의 세월을 깊은 바닷속에서 잠들고 있었던 고려시대의 난파선이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난파선 마도 1, 2, 3호는 서해안 뱃길을 통해 당시 수도였던 개경으로 물품을 조달하던 선박이었다. 천년의 세월을 물속에서 지낸 이 선박들에는 여러 가지 고려시대 실물들이 남아 있다. --- p.57~58
조선의 개항 초기에 일본 어민이 조선 어장에 진출한 이유는 조선 어장에서 잡히는 생선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과 일본이 달라 서로 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어종인 삼치, 장어, 멸치 등이 조선 어장에 많았으나 조선인은 조기, 명태, 대구 등을 좋아했다. 전자는 일본에서 고급 어종으로 돈벌이가 되는 생선이었지만, 조선 어장에서는 풍부하게 어획되어 저렴했다. 따라서 어종을 둘러싸고 조선 어민과의 경합이 적었고,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잡어는 조선 상인들이 매입해주었다는 것이다. --- p.88
《미암일기》를 통해 본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음식문화는 반찬거리를 포함해 생활필수품을 주로 가까운 사람들의 선물에 의해 충당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 수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종종 친지의 선물, 왕의 하사품이나 공물 배분을 통해 얻기도 했다. 특히 이웃이나 동료, 친척, 문생 등이 자주 선물을 보내왔는데, 자잘한 반찬거리에서 식량과 의복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었다. --- p.133
그 때문에 준치는 멸종의 위기에 빠졌고, 이에 용왕이 모든 어류를 모아놓고 준치 멸망지환의 대책을 토론했다. 그때 준치가 가시를 많이 갖도록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용왕은 모든 물고기에게 자기의 가시 한 개씩을 뽑아 준치 몸에 꽂아주라고 명령했다. 모든 물고기가 가시 한 개씩 준치 몸에 꽂으니 준치는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달아났는데, 뒤쫓아 가서까지 꽂으니 준치는 꽁지 부근에 가시가 많다4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멸종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제는 어획량이 적어 귀한 생선이 되었다. --- p.167~168
생선에도 품격의 수준이 있고 경제적 등급이 있다. 부잣집 반상차림엔 쇠갈비보다 비싼 영광굴비가 온전히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서민의 초라한 밥상에도 꽁치구이 한 토막 정도는 오를 수 있다. 게다가 계절마다 서로 다른 제철 생선을 구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다양하게 생선구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p.267
다식은 차와 함께 먹는 차과자의 일종으로, 송화다식?흑임자다식?오미자다식 등 천연의 식물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다식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다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식 중에 육포다식과 전복다식이 있다. 육포다식은 육포를 가루 내 다식판에 찍어내는 일종의 밑반찬이다. --- p.333
1960~70년대에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던 생선은 명태, 대구, 청어, 꽁치, 고래 등이었으나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현재 주로 잡히는 오징어, 멸치, 문어도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역의 채취량도 감소했다. 주체할 수 없이 잡히던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지자 오징어가 주 어종 자리를 차지했지만, 오징어도 이제 많이 잡히지 않는다. 오징어는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동해안 어민들 생계를 책임졌다.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를 이제 서해나 서남해에서 잡는다. --- p.375
저 : 정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회장과 대한가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학에서 서구 영양학을 공부했지만 한식 요리를 배우면서 한국 음식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성에 매료되었다. 30년 이상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한국의 밥, 채소, 고기와 장, 전통주 문화를 연구했으며, 고조리서 분석 및 종가음식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음식 연구를 지속해왔다. 또한 한식을 과학화하기 위해 김치 품질 측정기, 기능성 솔잎 맛김, 한방 맥주, 닭발을 이용한 전약 제조 등을 개발하여 제품 특허를 받았다.《서울의 음식문화》(1996)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음식 오디세이》(2008 세종도서 교양부문), 《천년 한식 견문록》, 《정혜경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음식 이야기》, 《조선 왕실의 밥상》(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통일식당 개성밥상》, 《발효음식인문학》 등을 썼고, ‘음식 3부작’으로 《밥의 인문학》(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 《채소의 인문학》(2018 국립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세종도서 교양부문), 《고기의 인문학》(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을 썼다. 이 밖에 《옛 그림 속 술의 맛과 멋》, 《세계의 한식을 맛보다》 등 식문화에 관한 글을 여럿 썼으며, 공저로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한국인에게 장은 무엇인가》, 《한국인에게 막걸리는 무엇인가》, 《식생활문화》, 《선비의 멋 규방의 맛》 등이 있다. |
|||||
| 이전글 | 새 옷에 가격표를 달 때 사용하는 ‘그거’ |
|---|---|
| 다음글 | 채소의 인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