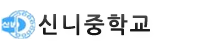설의 어원 |
|||||
|---|---|---|---|---|---|
| 작성자 | 최정규 | 등록일 | 10.02.12 | 조회수 | 578 |
|
설의 어원 설은 새해의 첫 시작이다. 설은 묵은해를 정리하여 보내고,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다시 출발하는 첫날이다. 그러고 그 어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섧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선조 때 학자 이수광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설날이 '달도일(怛忉日)'로 표기되었는데, '달'은 슬프고 애달파 한다는 뜻이요, '도'는 칼로 마음을 자르듯이 마음이 아프고 근심에 차 있다는 뜻이다. 한 해가 지남으로써 점차 늙어가는 처지를 서글퍼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사리다'[愼, 삼가다.]'의 `살'에서 비롯했다 설(說)이다. 각종 세시기(歲時記)들이 설을 신일(愼日)이라 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바짝 죄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설다. 낯설다'의 '설'이라는 말뿌리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낯선 곳이며 낯선 사람이다. 따라서 설은 새해라는 정신적, 문화적 낯섦의 의미로 생각되어 낯 '설은 날'로 생각되었고, '설은 날'이 '설날'로 바뀌어졌다는 말이다. 나이를 말하는 즉 "몇 살(歲)" 하는 '살'에서 비롯됐다는 연세설(年歲說)도 있다. 한국말을 유래시킨 우랄 알타이어계(語系) 중에서 산스크리트어(語) 는 해가 바뀌는 연세(年歲)를 '살'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 말에서 `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해가 돋아나듯 '새로 솟는다'는 뜻과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구분이나 경계를 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두 설날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살'이 '설'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 밖에 한 해를 새로이 세운다는 뜻의 "서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 설' 또는 '설날'을 가리키는 한자어는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시(歲時), 세초(歲初), 연두(年頭), 연수(年首), 연시(年始)" 등이 있다. 하지만 그 한자말들은 ‘설날’만큼 정감어린 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설날 아침을 뜻하는 한자말 '원단(元旦), 원조(元朝), 정조(正朝), 정단(正旦)"등은 차라리 ‘설날 아침’보다 정겹지는 못하다. 설날의 유래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겨레가 명절로 지내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설날의 유래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隨書)’에는 신라인들이 새해의 아침에 서로 예를 차려 축하하고, 왕이 잔치를 베풀며, 일월신에게 절하고 예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백제 고이왕 5년(238) 정월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책계왕 2년(287) 정월에는 시조 동명왕 사당에 참배하였다고 한다. 이때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설날과의 비슷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신라 때에도 정월 2일과 정월 5일이 포함된 큰 제사를 1년에 6번씩 지냈다고 하는데, 이를 보아 이미 설날의 풍속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는 설이 9대 명절의 하나로 즐겼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을 4대 명절의 하나로 지내, 이미 이때에는 설이 지금처럼 우리 겨레의 큰 명절로 자리 잡았음을 것으로 보인다. 설날의 세시풍습 설빔 설날 때 입기위해 준비한 옷을 ‘설빔(세장:歲粧)’이라 한다. 차례를 지낸 뒤 대보름까지 갈아입지 않기도 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설날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을 '까치저고리'라 한다. 차례 지내기, 성묘 아침 일찍 가족, 친지들이 손집에 모여,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과 술을 조상들에게 대접하는 제사를 지낸다.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향교나 산소를 찾아 성묘도 한다. 세배와 절하는 법(공수법:拱手法) 새해 아침에 차례가 끝나면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새해의 복을 빌며, 덕담을 나누는 인사의 관습은 오늘날에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세배도 절하는 법을 모르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절하는 법을 알아보자. 손은 공손하게 맞잡아야 하며 손끝이 상대를 향하게 하지 않고, 누워있는 어른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흔히 어른에게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는 명령조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새배를 하면서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등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절에 맞지 않는다. 절을 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라도 성년이면 그를 존중하는 대접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좋다. 세배를 한 뒤 일어서서 고개를 잠간 숙인 다음 제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세배를 받은 이가 먼저 덕담을 들려준 후 이에 화답하는 예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덕담은 덕스럽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게 좋으며 지난해 있었던 나쁜 일이나 부담스러워할 말은 굳이 꺼내지 않는 게 미덕이다. 공수법이란 어른 앞에서나 의식 행사에 참석했을 때 공손하게 손을 맞잡는 방법을 말한다. 공수의 기본 동작은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편 다음, 앞으로 모아 포갠다. 그리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 끼고 집게손가락부터 네 손가락은 포갠다. 또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의 손잡는 법은 남녀 모두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복조리 달기 조리장수가 설날 전날 밤부터 복조리 사라고 외치며 돌아다닌다. 각 가정에서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복조리를 사는데, 밤에 미처 사지 못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산다. 일찍 살수록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므로 그 해의 행복을 조리와 같이 일어 얻는다는 뜻에서 이 풍속이 생겼다고 본다. 문안비(門安婢)와 청참(聽讖) 사돈집 사이에는 부인들이 하녀를 서로 보내어 새해 문안을 드리는데, 이 하녀를 '문안비'라 했다. 민가에는 벽 위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빌고, 설날 꼭두새벽에 거리에 나가 맨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1년간의 길흉을 점쳤는데, 이를 '청참'이라 했다. 야광귀(夜光鬼) 쫓기 야광(앙괭이)이라는 귀신은 설날 밤, 인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을 두루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리는데 그 신의 주인에게는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귀신이 무서워 모두 신을 감추거나 뒤집어 놓은 다음 잠을 잤다. 그리고 채를 마루 벽이나 뜰에다 걸어 두었다. 그것은 야광귀신이 와서 채의 구멍을 세느라고 아이들의 신을 훔칠 생각을 잊고 있다가 닭이 울면 도망간다는 재미있는 풍속이다. 오행점(五行占)과 원일소발(元日燒髮) 나무에 오행인 금, 목, 수, 화, 토를 새겨 장기쪽 같이 만들어 이것을 던져서 나온 것을 보아 점괘를 얻어 새해의 신수를 점쳤는데 이를 '오행점'이라 했다. 또 원일소발은 지난 1년간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가 설날 저녁에 문 밖에서 태우는 풍습이다. 머리카락을 태울 때 나는 냄새로 악귀나 나쁜 병을 물리친다는 믿음이다. 해지킴(수세:守歲)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믿었으며, 아이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면 잠든 아이들의 눈썹에 떡가루를 발라주어 놀려주었다. 이것은 설맞이 준비가 바쁘니 이 한밤은 잠자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데서 생긴 말로 보인다. 섣달 그믐날은 자지 않고 설을 지킨다는 뜻으로 '수세한다'고 하였다. 설날의 시절음식 세배하러 온 사람에게는 설음식(세찬:歲饌)과 설술(세주:歲酒), 떡국 등을 대접한다. 떡국은 꿩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제격이었으나 꿩고기가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넣고 끓였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겼다. 설을 쇨 때 반드시 떡국을 먹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떡국에 '첨세병(添歲餠: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는 별명까지 붙이기도 하였다. 설날에 술을 마시는데 '세주불온(歲酒不溫:설술은 데우지 않는다)'이라고 하여 찬술을 한잔씩 마시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정초부터 봄이 든다고 보았기 때문에 봄을 맞으며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었다. 설에는 도소주(屠蘇酒)를 마시었는데 이 술은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술이다. 도소주는 육계(肉桂:한약재), 산초, 흰삽주뿌리(한약재 백출을 만드는 풀), 도라지, 방풍(한약재) 등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만든 술이었다. 그러므로 이 술을 마시면 모든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날에 즐기는 전통놀이 설날 아침 차례와 성묘를 지낸 다음 친척과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이 놀이들은 설날부터 시작하여 설 명절의 마지막인 정월 대보름날까지 즐겼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 날리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바람개비놀이, 쥐불놓이(쥐불놀이), 등이 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놀이로는 풍물굿이 어느 지방에서나 행해졌으며, 지신밟기, 석전(石戰), 동채싸움(차전놀이), 나무쇠싸움, 횃불싸움, 달불놀이, 달집사르기, 고싸움놀이, 도깨비놀이, 횃불 싸움, 별신굿, 지신밟기, 거북놀이, 북청사자놀음, 광대놀이, 처용 놀이와 계명(鷄鳴)점, 보리싹 점, 부름 깨기, 액연 태우기 등이 있다. 온 마을 사람 나아가 이웃마을 사람들과의 한 덩어리가 되어 즐기는 이 집단놀이는 각 개인과 가정, 마을 공동체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이다. 나아가 집약적 노동을 요구하는 농경 사회에서 두레나 품앗이 등의 협동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이러한 공동놀이 속에 있었다. 설날과 구정(舊正)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날을 '구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설날에 대한 민족적 자각이 결여된 말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 설은 태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일제강점기 이후 설의 수난은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일본총독부는 1936년 '조선의 향토오락'이란 책을 펴낸 이후 우리말, 우리글,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우리의 설도 양력설에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총독부는 민족의 큰 명절 '설'을 '구정'이란 말로 격하시켜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려 광분하였다. 광복 후에도 양력이 기준력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력설은 1989년까지 제도적으로 지속되었다. 음력설인 고유의 설은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단 하루 공휴일이었으며, 이중과세라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억제되어 왔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고유의 명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1989년 2월 1일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설날인 음력 1월 1일을 전후한 3일을 공휴일로 지정, 시행하여 이젠 설날이 완전한 민족명절로 다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식민지 시절의 쓰레기라 할 수 있는 '구정'이란 말을 삼가고, 절대 '설날'이란 말을 써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설날을 맞아 우리 자신만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비, 공덕행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을 신일(愼日) 즉, '삼가고 조심하는 날'임을 생각하여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 네이버에서 퍼 왔습니다 |
|||||
| 이전글 | 2013학년도 학년별 학급운영 가정통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