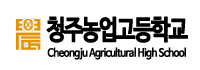6·25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 안 가리고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 |
|||||
|---|---|---|---|---|---|
| 작성자 | 주재석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
||||
|
1953년 10월호 ‘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는 제목 위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특이한 감염병을 다룬다.” 그런데 정작 이 질병은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이 병이 미국인의 관심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자국의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장에서 이 괴질로 쓰러져갔기 때문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해를 넘기며 장기전으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51년 봄부터 전황은 38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에 놓였다.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쌍방은 1951년 7월10일 첫 공식 휴전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은 계속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남북 간 경계선이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 시점의 군사접촉선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회담 종료일(1953년 7월27일)까지 전선에서는 치열한 혈전이 계속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인이 바뀌는 고지 쟁탈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는 불가피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참혹한 전선에 정체 모를 병마까지 똬리를 틀고 있었다.
■ 병마의 정체
글머리에 소개한 1953년 논문에서는 이 감염병을 새로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보고했다. 병명 그대로 환자에서는 고열과 안구 충혈, 구강 출혈 등의 징후가 나타났다. 1951년 초여름 전선에서 첫 감염이 나온 이후로 그해에만 1000여명의 미군 환자가 발생했다. 미국 의료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1940년대 일본과 러시아(구소련) 과학자들이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발병 보고를 한 적은 있었지만, 미국 의료진에게는 난생처음 보는 ‘신종감염병’이었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환자가 끊이지 않았다. 병마의 공격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기에 서로 상대가 생물학전을 감행한다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늦봄(5~6월)과 늦가을(10~11월)에 환자가 급증했다. 나머지 기간에는 산발적으로 발병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체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그렇게 사반세기가 흘러갔다.
1978년 마침내 그 괴질의 원인이 들쥐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한국의 바이러스학자 이호왕 박사(1928~)가 한탄강 유역에 서식하는 등줄쥐의 폐 조직에서 문제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곧이어 이 바이러스는 ‘한탄바이러스’로 불리게 된다. 과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그것이 처음 분리된 장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생물학계의 관례였다.
한탄바이러스의 발견을 계기로 진단검사가 가능해지자 한탄바이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세계 도처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81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하나로 묶어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속’으로 분류하였다. 속은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도 나오는 생물 분류 체계(종-속-과-목-강-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분류 단위이다. 한타바이러스 속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이 섞여 있다. 한때는 인체 병원성 한타바이러스종은 구대륙에 국한되어 분포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1993년까지는 그랬다. |
|||||
| 이전글 |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 |
|---|---|
| 다음글 |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